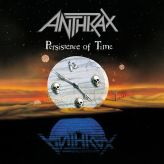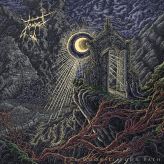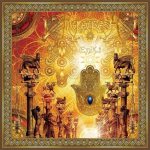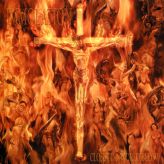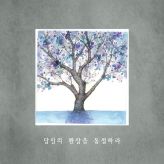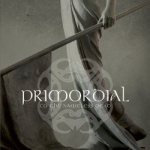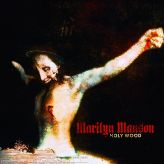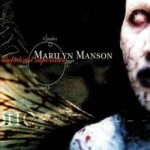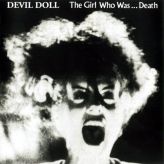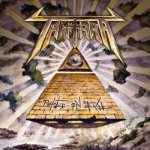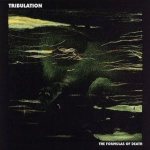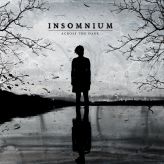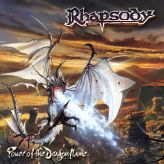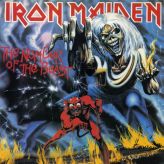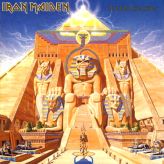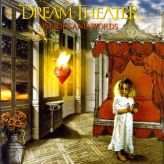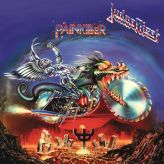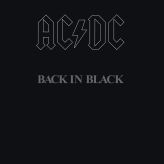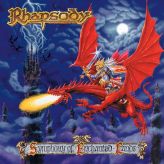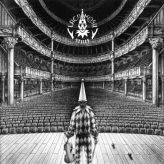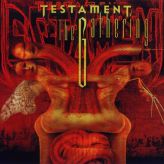W.A.S.P. – W.A.S.P. –
 The Crimson Idol (1992) The Crimson Idol (1992) |
100/100 Aug 31, 2022 |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올해는 The Crimson Idol의 발매 30주년이다. 평소 같았다면 앨범의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 개별 곡들에 대한 감상, 그리고 앨범의 스토리까지 줄줄 늘어놓았겠지만, 이미 다른 분들이 각자의 리뷰에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엔 생략하고 싶다. 대신 앨범을 들으며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들을 짤막하게 다루어 보고 싶다.
사실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접했던 W.A.S.P.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그랬기에 이들이 초기에는 망나니 같은 컨셉을 잡고 날뛰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무작정 들었던 앨범이다. 또한 앨범의 스토리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 었기 때문에 이 앨범을 처음 들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W.A.S.P.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첫 번째 곡 The Titanic Overture가 울려 퍼지고 곧이어 The Invisible Boy에서 Blackie Lawless의 허스키한 보컬이 등장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이 밴드에 빠져들었다.
앨범의 드라마틱한 구성과 스토리뿐 아니라, 보컬 및 각 세션, 레코딩 스타일을 비롯하여 앨범 커버까지 전부 마음에 쏙 들었던 나는 소위 3대 헤비메탈 컨셉 앨범이라고 불리우는 Operation: Mindcrime과 Streets: A Rock Opera도 접해 봤지만 The Crimson Idol만큼의 임팩트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물론 두 앨범도 우수하지만, The Crimson Idol은 개인적으로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다른 W.A.S.P.의 앨범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앨범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질 만큼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 느끼는 감정은 각별한 편이다.
이 앨범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적으로 ‘좀 더 듣기 좋으니까’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지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앨범이 가장 진정성 있는 작품 중 하나로 느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물론 대부분의 예술 작품이 창작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진정성 또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그냥 대충 돈벌이를 위해 만든 것 같다고 느껴지는 반면 어떤 작품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은 Blackie Lawless의 모든 것을 담아낸 혼신의 역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기에 개인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던 작품이었던 것 같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투영한 Jonathan의 캐릭터와 앨범의 스토리 및 가사뿐 아니라, 이를 표현해내는 Blackie Lawless의 목소리가 그 진심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5번 곡 The Gypsy Meets The Boy에서 “I just wanna be The crimson Idol of a million”라며 락스타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대목이나, Doctor Rockter에서 “Help me”라고 절규하는 부분 등에서 Blackie의 진심을 느끼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Hold On To My Heart와 마치 뮤지컬의 클라이맥스 같은 느낌을 주는 The Great Misconceptions Of Me의 보컬 파트에서도 이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Blackie Lawless가 이 앨범을 만들 당시 W.A.S.P.의 이름이 아닌 솔로 앨범으로 발매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이고도 진심 어린 앨범이었을 것이다.
컨셉 앨범으로서 이 앨범이 마음에 드는 다른 이유는 이 작품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물론 밴드 리더의 자전적인 내용을 다룬 컨셉 앨범은 The Who의 Tommy와 Pink Floyd의 The Wall, 그리고 앞서 언급한 Savatage의 Streets: A Rock Opera 등 적지 않은 선례가 이미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공연 도중 기타 줄로 목을 매서 자살한다는 독보적인 결말은 잊기 힘든 큰 충격을 주었다. 앞서 언급한 앨범들도 앨범 속 주인공들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지만, 적어도 이 앨범들은 희망적이거나 최소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결말로 이어진다. 하지만 The Crimson Idol은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저지른 뒤에야 자신이 원했던 것은 오직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었음을 깨닫는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고 어둡다.
물론 희망적인 결말을 좋아하는 것과 비극적인 결말을 좋아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지만,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진 비극은 비록 어둡고 암울하더라도 해피엔딩 그 이상의 여운을 남겨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The Crimson Idol이 더욱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 같다. 또한 The Crimson Idol의 결말이 어둡고 비극적일지언정 염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인상깊다. 비록 Jonathan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The Crimson Idol의 결말은 완전히 암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록과 메탈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나도 팬들의 우상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또한 이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록 스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지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The Crimson Idol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과 같이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허영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The Crimson Idol의 주제의식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다면 부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의식을 통해 이 앨범은 청자로 하여금 Jonathan과 같은 실패를 겪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W.A.S.P.의 The Crimson Idol은 단순히 잘 만들었고 듣기에도 좋은 앨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Blackie Lawless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내서 The Crimson Idol을 만들어냈고, Jonathan은 기타 줄로 자신의 목을 매단 뒤에야 자신의 진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진심을 가득 담아 만들어낸 일생일대의 역작인 The Crimson Idol은 우상의 몰락을 다루며 충격적인 비극으로 치달으면서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결국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가치까지 지니는 이 작품이 내가 지금껏 들은 최고의 앨범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100/100 ... See More 4 likes 4 likes |
 Ethereal Shroud – Ethereal Shroud –
 Trisagion (2021) Trisagion (2021) |
95/100 May 31, 2022 |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Trisagion은 영국의 뮤지션 Joe Hawker에 의해 탄생한 원맨 밴드 Ethereal Shroud의 ‘마지막’ 앨범이다. 2015년에 발매된 전작 They Became the Falling Ash는 평균 20분 가량의 대곡 세 개로 이루어지며 차디차고 음울한 분위기로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앳모스퍼릭 블랙 메탈을 들려주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Ethereal Shroud는 2020년 싱글 Lanterns를 발표하며 생존신고를 했고, 뒤이어 Trisagion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앨범을 발매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본래 2021년 3월 발매를 목표로 했던 Trisagion은 모종의 사유로 인해 발매가 연기되었고, 그 해 1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매될 수 있 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만들어진 이 앨범은 여러모로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레코딩 작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Joe Hawker의 자살 시도로 인해 영영 발매되지 못 할 뻔하기도 했던 앨범이다.
하지만 인고의 시간 끝에 세상에 나온 이 앨범은 그 기대를 보상하고도 남는 수준의 훌륭한 작품이었다. 전작 They Became the Falling Ash까지는 혼자서 모든 작업을 Joe Hawker가 처리했던 반면 Trisagion은 드럼, 베이스 등을 세션 연주자들을 따로 구해 녹음하였으며,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은 Panopticon과 Saor 같은 밴드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Spenser Morris가 담당했다. 그래서인지 전작에 비해 사운드가 더욱 깔끔하면서도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준다.
앨범의 첫 번째 트랙 Chasmal Fires는 27분이 넘어가는 거대한 곡이며 그 장대한 분량에 맞게 천천히 비장미 넘치는 분위기를 쌓아 올린다. 뒤이어 첫 멜로디가 등장하며 잠깐 분위기를 환기했다가 곧이어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출하기 시작한다. 장르 특유의 거친 면모 속에서도 돋보이는 리드 기타의 멜로디가 단숨에 귀를 사로잡을 뿐 아니라, 은은히 울리는 키보드 사운드의 매력 또한 인상적이다.
지속적으로 리드 기타 멜로디가 곡을 이끌어 가다가 11분 접어들어서는 여성 보컬과 비올라의 선율이 등장하며 분위기를 전환하고 잠깐 쉬어갈 틈을 준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며 Alcest 같은 밴드가 잘 활용하는 몽환적인 느낌을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해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잠깐의 휴식 이후 곡은 다시 시니컬한 에너지를 격정적으로 뿜어내며, 적절한 변주를 통해 지루함을 방지해 준다. 18분 이후로는 곡이 클라이맥스로 접어드는 듯 고조된 느낌과 몽환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며, 곡 막바지에서 도입부의 멜로디가 반복되고 비올라의 처연한 소리가 더해지며 대미를 장식한다.
이처럼 이 곡은 전작의 1번 트랙 Look upon the Light처럼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는 앨범의 킬링 트랙으로, 20분이 훨씬 넘는 곡 길이에도 역동적인 전개와 환상적인 분위기로 지루하지 않고 매력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 곡 Discarnate는 속도감 있는 도입부로 첫 번째 곡과는 색다른 느낌을 주고, 비교적 빠른 전개를 보여주는 와중에도 뚜렷한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이 곡 또한 전반적으로 몽환적이고 차가운 분위기와 격정적인 연주 및 보컬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여기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전개가 더해져 14분 가까운 긴 곡임에도 길지 않게 느껴지는 트랙이다. 특히 곡 후반부에서 비장미가 느껴지는 멜로디와 심포닉 스타일이 더해지는 부분도 빼놓을 수 없었다.
마지막 곡 Astral Mariner는 쓸쓸한 느낌의 건반 멜로디로 시작하며, 둠 메탈 느낌이 드는 좀 더 진중한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만 5분대 이후로는 다시금 감정이 북받치듯이 터져 나오는 곡 전개가 이어지며, 멋진 멜로디와 클린 보컬이 어우러지는 구간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지막 곡답게 전반적으로 좀 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곡이 진행되는 느낌이고, 막바지에 분위기를 잠깐 가라앉혔다가 비장미 넘치는 마무리로 완벽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낸다.
CD버전 보너스 트랙인 Lanterns는 앞서 언급했듯 2020년에 먼저 공개된 곡이며, Joe Hawker가 자살 기도를 했다가 목숨을 건진 뒤에 만든 곡이다. 비록 보너스 트랙이지만 본래 정규 2집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곡인 만큼 이 곡 또한 완성도가 높으며 분위기와 스타일 면에서 앞선 곡들과 유사하다. 이 곡에서도 멜로디가 부각되는 편이며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느낌도 인상적이다.
앨범 종합적으로 볼 때 1번 트랙 Chasmal Fires의 임팩트는 처음 들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강렬하며, 나머지 트랙들의 완성도 또한 아주 높은 편이기에 한 시간이 넘는 긴 앨범을 완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래도 워낙 곡들이 길어서 전반부에 비하면 후반부가 상대적으로 늘어지는 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영리하게도 앨범의 마지막 몇 분에 끝내주는 마무리를 보여줌으로써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평균 20분 이상(보너스 트랙 제외)의 세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면서도 다채로운 곡 전개와 빼어난 멜로디, 차갑고도 환상적인 분위기로 앳모스퍼릭 블랙 메탈 특유의 장르적 약점을 극복한 작품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분위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칫하면 쉽게 지루해지거나 진부해질 수 있는 약점을 다방면으로 보완하고 있었다. 본 작품은 앳모스퍼릭 블랙 메탈로 분류되고는 하지만 멜로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비올라가 이끌어가는 심포닉 사운드와의 조화 또한 이 앨범의 특징이다. 더 나아가 (퓨너럴)둠 메탈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진중한 느낌과 포스트 록 스타일의 은은하고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2010년대 이후 메탈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앨범들이 종종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 역시 하나의 장르적 뿌리를 두되 타 장르의 특징을 아낌없이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퓨전 음식을 만들어낸 인상을 준다. 또한 전작 They Became the Falling Ash가 매우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반면 이번 앨범은 여전히 차가우면서도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더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고 본다. 앨범 커버가 주는 느낌이 두 앨범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전작이 칙칙한 흑백 사진으로 담긴 혹한의 겨울 숲 느낌이라면 이번 앨범은 좀 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풍경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이 앨범은 더 많은 메탈 팬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Trisagion은 Metalstorm, Sputnikmusic, Rate Your Music, The Metal Archives 등 사이트의 성향과 관계없이 전작을 뛰어넘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Black Metal Promotion 유튜브 채널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지명도를 높이기도 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Ethereal Shroud가 안티파시즘을 지향하는 밴드라는 것이다. 또한 Joe Hawker는 Violet Cold(Emin Guliyev)의 뒤를 이어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다. 하지만 Rob Halford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의 ‘메탈 갓’ 칭호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Ethereal Shroud의 음악 역시 Joe Hawker의 개인적 신념, 사상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여운과 감동을 주고 있다. 물론 예술가의 의도와 신념은 대개 작품에 투영되는 편이지만, 온갖 부류의 극단주의적 성향이 판을 치는 블랙 메탈 계열에서 특정 사상과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애써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의 음악은 고통과 역경을 표현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므로 충분히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너스 트랙 Lanterns의 경우 Joe Hawker의 자살 기도 이후 정신치료를 거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의 회고와도 같은 곡인데, 이런 식으로 고통과 상실감 등을 노래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청자에게 희망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음악에 가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1번 트랙 Chasmal Fires 또한 Joe Hawker의 PTSD와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하는 곡이다. 하지만 이 앨범의 아름다움은 마치 진주조개가 고통 끝에 만들어낸 빛나는 진주와도 같기에 듣는 이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 준다.
결론적으로 이 앨범은 장대한 곡 구성과 이에 어울리는 어둡고 비장한 분위기, 매력적인 멜로디와 여러 장르의 복합적인 스타일이 고루 녹아들어 탄생한 2021년 최고의 메탈 앨범이라고 생각한다. 앨범이 계획되고 발매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 작품 속에는 Ethereal Shroud를 이끄는 Joe Hawker의 역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20년 말 Trisagion의 앨범 커버가 공개된 뒤로도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기다림을 충분히 보상해주고도 남았던 앨범이었다.
하지만 Ethereal Shroud는 Trisagion의 정식 발매 시기에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Trisagion이 마지막 앨범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Trisagion으로 Ethereal Shroud를 처음 접하고 좋아하게 된 팬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5월 13일, Ethereal Shroud는 복귀를 선언했다. Joe Hawker는 개인적인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그를 응원해준 팬들의 역할 또한 컸으리라고 본다. 물론 곧바로 새 앨범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작품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니 Ethereal Shroud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
97/100 ... See More 4 likes 4 likes |
 Teitanblood – Teitanblood –
 Death (2014) Death (2014) |
95/100 Nov 30, 2021 |

“대체 이런 걸 왜 들어요?”
메탈헤드라면 한 번쯤은 메탈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메탈 장르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익스트림 메탈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 다른 메탈헤드조차 질색할 만한 극단적인 스타일의 밴드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극단 중의 극단을 추구하는 밴드들 또한 잘나가는 팝스타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그 규모는 작을지언정 팬들로부터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스페인의 블랙/데스 메탈 밴드 Teitanblood역시 그러한 부류에 해당한다. 2003년 리더 NSK에 의해 결성된 이들은 캐나다의 Blasphemy로부터 시작된 속칭 ‘워 메탈’ 밴드로도 분류되는 밴드이다. 물론 이들의 음악적 테마가 ‘전쟁’과는 거리가 먼 편이지만, 지극히도 거칠고 난폭한 음악적 스타일은 이쪽 계열을 대표하는 Archgoat, Revenge, Proclamation 같은 밴드들과 비교해 봐도 뒤처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앞서 언급한 밴드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블랙/데스 계열 밴드들과 비교해 볼 때 가지는 뚜렷한 차이점은 대곡을 많이 쓴다는 점이다. 블랙/데스 계열 밴드들이 일반적으로 블랙 메탈과 데스 메탈뿐 아니라 그라인드코어로부터 받은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대개 곡들의 길이가 긴 편이 아니지만, Teitanblood의 경우 10분이 넘어가는 트랙들을 정규 앨범에서도 EP에서도 수록하곤 한다.
물론 단순히 곡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특징은 될 수 있어도 반드시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곡 구성은 자칫하면 쉽게 지루해진다는 비판을 받기 십상인데, Teitanblood의 두 번째 정규 앨범 Death는 무질서함 속에서도 나름의 짜임새와 빌드업을 갖춤으로써 총 길이가 70여 분에 달하는 블랙/데스 앨범의 선례를 찾기 힘든 대작을 만들어냈다.
보통 한 시간이 넘어가는 대작 앨범이나 블랙/데스의 기념비적인 앨범 Fallen Angel of Doom....을 본받은 많은 블랙/데스 앨범들이 앨범의 도입부에 스산하거나 웅장한 분위기의 도입부를 넣어 살살 분위기를 내는 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Teitanblood 역시 1집 Seven Chalices에서 웅장함이 느껴지는 인트로를 활용한 바 있는데, 2집 Death에서는 마치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울부짖듯 앨범이 시작되자마자 제로백 1초의 급발진을 보여준다.
첫 번째 곡 Anteinfierno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세션이 극한으로 치닫는데, 겹겹이 쌓인 보컬의 절규와 매섭게 찢어지는 기타 솔로, 헤비하기 그지없는 리프 그리고 매서운 드러밍으로 단 몇 초 만에 이들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서서히 경사면을 오르다 낙하하며 시작하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시작하자마자 전속력으로 급발진하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한 짜릿함을 느끼게 해 준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곡 Sleeping Throats of the Antichrist는 단순히 광폭함에서 끝나지 않는 이들의 또 다른 매력을 체감하게 해 준다. 첫 번째 곡과는 정 반대로 무겁고 느린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이 곡은 물론 블랙/데스 특유의 야만스러운 난폭함이 강조되지만, 혼돈 속에서도 헤비한 리프들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 또한 내달리는 스타일과 육중한 브레이크다운을 오가는 와중 다채롭고 의외로 짜임새 있는 구성까지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곡 후반부에서 육중한 리프로 서서히 쌓아 올리는 마무리는 그야말로 극한의 장르적 쾌감을 선사해 준다. 실제로 이 곡은 밴드의 리더 NSK가 인터뷰를 통해 리허설 당시 가장 좋아했던 곡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인터뷰를 진행했던 인터뷰어 역시 이 곡에 대해 ‘heavy-as-fuck string-bending guitar manoeuvres’라고 표현한 만큼 앨범의 킬링 트랙으로 손색이 없는 곡이다.
뒤를 잇는 곡들 역시 대곡은 대곡 나름대로, 짧은 곡은 짧은 곡 나름대로 블랙/데스 특유의 장르적 특징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이들만의 독자적인 특색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이 단순히 곡과 앨범의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그 여운 또한 길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4번 트랙 Cadaver Synod 같은 10분 내외의 곡들에서 줄곧 거세게 밀어붙이면서도 곡 사이사이 잠깐 쉬어 가는 부분을 통해 살짝 피로감을 덜어주고, 가장 짧은 3분대의 곡 Unearthed Veins에선 착착 감기는 리프와 무게감 있는 구성으로 대곡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도 했다.
거칠고 난폭한 와중에도 때로는 느리고 무게감 있는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대곡 구성에서 유발될 수 있는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지닌다. 여섯 번째 곡 Burning in Damnation Fires의 중후반부가 그러한 완급조절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 곡에서도 듣는 재미를 더해주는 리프들이 돋보이며, 마지막 곡 Silence of the Great Martyrs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마지막 곡 Silence of the Great Martyrs의 경우 메탈 파트는 7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러시아 정교회 성가를 샘플링하여 만든 음산한 분위기의 마무리이다. 그 때문에 메탈 파트만 놓고 보면 앨범의 총 길이는 한 시간이 약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곡 위주의 대작 블랙/데스 앨범이라는 이 앨범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블랙/데스의 진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음침하고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거대한 곡 구성 속에서 나름의 치밀한 구조 또한 갖추고 있다. 혼란스러운 전개의 와중에도 무게감 있는 리프를 사용한 브레이크다운을 선보임으로써 대곡 구성에 어울리는 완급조절을 가능케 하고, 또 이러한 리프들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독적인 스타일로 청자를 매료시킨다. 그뿐 아니라 거칠기 짝이 없으면서도 각 세션의 매력을 고루 느낄 수 있는 레코딩 역시 돋보이며, 특히 라이브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밴드의 특징을 활용하여 겹겹이 쌓인 보컬 및 기타를 통해 꽉 찬 느낌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꽉 찬 느낌은 단 두 명의 멤버가 작은 리허설 방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곡들의 배치 역시 꽤나 영악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곡이 인트로도 없이 초장부터 몰아세우면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겨 주고, 두 번째 곡부터는 완급조절을 통해 한 시간 이상 되는 앨범을 차근차근 진행시켜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곡 사이사이에 음산한 분위기의 간주를 배치하여 잠깐씩 쉬어 가는 부분을 넣은 것 역시 긴 곡과 긴 앨범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정공법으로 나가는 방법을 택하면서도 그 뒤로는 각종 방법을 통해 완급조절을 함으로써 긴 앨범을 보다 쉽게 완주하게 해 주는 나름 치밀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전에 리뷰했던 Vital Remains의 Dechristianize 앨범이 대곡 위주의 한 시간짜리 데스 메탈 작품임에도 네오클래시컬한 솔로를 덧붙인 다채로운 곡 구성으로 지루함을 극복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토록 파괴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악한 면모까지 갖춘 Teitanblood의 핵심 NSK에 따르면 이들은 의도적으로 라이브를 하지 않지만, 그 덕분에 더욱 풍성한 사운드의 스튜디오 앨범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Angelcorpse의 멤버였던 Pete Helmkamp가 인터뷰에서 '음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으나 그것이 녹음되어 재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따라서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정수이다 '라고 한 것과는 달리 NSK는 Bathory의 Quorthon을 예로 들며 굳이 라이브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마치 Deathspell Omega 같은 밴드처럼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며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편인데, 3집에서 멤버들이 네 명으로 늘어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사족이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배후에 핀란드의 앨범 커버 아티스트 Timo Ketola가 있었다는 것인데, Timo Ketola는 Teitanblood의 모든 정규 앨범 커버 아트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밴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후에서 음악 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그 밖에도 밴드는 Proclamation, Necros Christos 같은 밴드와 스플릿을 발매하며 교류를 다지거나 EP에 수록된 곡 Purging Tounges에서는 스페인의 유명 배우를 기용하여 내레이션을 맡기는 등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되 한편으로는 활발한 인적 교류를 이어오는 외향적인 면모도 알게 모르게 보여주었다.
Teitanblood의 2집 Death가 발매된 후 5년 뒤인 2019년에 공개된 3집 The Baneful Choir 역시 이들만의 파괴적인 블랙/데스 스타일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대곡지향적인 부분에서 다소 탈피하기도 했으나, 일부 곡에서는 여전히 8분 이상의 대곡을 선보였으며 때때로는 비교적 멜로딕한 기타 솔로까지 시도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3집 역시 팬들로부터 여전하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들의 색깔이 가장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2집 Death를 가장 선호한다. 더욱이 이 앨범은 Pitchfork를 비롯한 각종 웹사이트에서 2014년 최고의 메탈 앨범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익스트림 메탈 내에서도 가장 매니악한 스타일인 블랙/데스 메탈 밴드로서 상당히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글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처럼 거칠고 난폭하기 짝이 없는 음악을 왜 좋아하는 것일까? 과거에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 등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 팽배했던 것처럼 폭력적인 음악도 폭력성에 중독된 사람이 더 큰 폭력성을 추구하기 위해 듣는 것일까?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정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폭력적인 음악은 폭력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허기를 느끼면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지 음식을 먹고 더 큰 허기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폭력적인 음악(여기에는 영화, 게임 등 어떠한 예술이나 매체가 해당될 수 있다.)은 분노와 같은 폭력적인 욕구의 해소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폭력적인 음악도 폭력을 다루는 게임 등이 인기를 끄는 것처럼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난폭하고 무질서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취향에 맞고, 이것이 욕구 충족에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기에 극단적인 장르에서조차 소수이지만 충성스러운 팬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발 더 나아가 데스 메탈이든 뭐든 무엇을 듣더라도 “그런 걸 왜 듣냐?”라고 편견 어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초록색이 좋은 건데?” 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캐묻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좋다는데 굳이 이유를 묻고 따질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웹툰 작가 원사운드의 명언을 활용한 다음의 표현으로 허접한 글을 마친다.
“시바 음악듣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듣는거지”
96/100 ... See More 8 likes 8 likes |
 Darkspace – Darkspace –
 Dark Space III (2008) Dark Space III (2008) |
100/100 Sep 30, 2021 |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판타지나 SF, 또는 추상적인 영역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테마의 분위기를 음악으로 구현하는 것처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우주를 소재로 한 음악 역시 존재한다. 메탈 음악 장르 내에서도 우주와 천체 등을 소재로 삼는 밴드들이 몇몇 있고, 특히 블랙 메탈 밴드들 중에서 소위 코스믹 블랙 내지는 스페이스 블랙 등으로 분류되는 밴드들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구사한다.
이러한 코스믹 블랙 메탈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구자를 들자면 단연 스위스의 Darkspace일 것이다. 물론 90년대 중반 이후 Arcturus, Limbonic Art, Odium 등 심포닉 블랙 계열에서 이미 우주를 소재로 한 몇몇 블랙 메탈 밴드들이 등장하기도 했고, 스위스에서도 Samael이 4집 Passage부터 우주적인 테마와 그러한 분위기의 음악을 구사했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면 Beherit의 앨범 Drawing Down the Moon이나 Burzum의 곡 My Journey to the Stars처럼 우주 혹은 천체를 소재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Darkspace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밴드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고, 이것이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Alrakis, Midnight Odyssey, Mare Cognitum 등과 같은 코스믹 블랙 메탈 밴드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코스믹 블랙 메탈 밴드들 이외에도 많은 앳모스퍼릭 블랙 메탈 밴드들이 대개 원맨 밴드로 구성되거나 라이브 공연을 하지 않는(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특이하게도 3인조 밴드였던 Darkspace는 때때로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Hellfest같은 대형 페스티벌의 무대에 오른 적도 있다.
Darkspace는 Paysage d'Hiver로도 알려져 있는 만능 뮤지션 Wroth와 기타리스트 Zhaaral, 그리고 여성 베이시스트 Zorgh의 3인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9년 Zorgh가 탈퇴하면서 현재는 2인조 밴드로 남아 있다. 드러머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드럼머신으로 곡을 녹음했으며, 라이브에서도 드럼 및 앰비언트 파트 등을 틀어놓고 공연을 진행한다.
여러모로 컨셉도 특이한 밴드인데, 앨범명과 곡명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규칙에 맞게 넘버링을 하는 식으로 앨범과 곡의 제목을 붙인다. 또한 기본적으로 곡에 가사가 따로 없고 보컬은 멤버들의 찢어지는 절규가 대부분이다. 간혹 등장하는 샘플링은 2001: A Space Odyssey, Alien, Event Horizon 등등의 SF 영화에서 따왔다.
현재까지 총 4장의 정규 앨범과 초창기 데모, 그리고 이 데모를 리메이크하여 재녹음한 EP가 Darkspace의 전체 디스코그래피이며, 그중에서도 이번에 리뷰할 3집 Dark space III가 이들의 최고작으로 손꼽히는 편이다.
초기 데모와 1집부터 칠흑같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거세게 휘몰아치는 전개로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넘치는 음악을 선보였던 이들은 3집 Dark space III에서 스타일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지글지글한 기타 톤과 거칠고 투박한 레코딩, 비인간적으로 빠르고 규칙적인 드럼과 미지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담아내는 듯한 보컬의 절규 등이 결합된 Darkspace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여타 코스믹 블랙 메탈 밴드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압감을 선사해 준다.
1집이 특유의 반복적이고 강렬한 리프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거칠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었다면 2집은 더욱 거대한 대곡 구성에 좀 더 분위기를 강조한 스타일로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2008년 발매된 3집은 1, 2집의 스타일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더욱 인상적이고 웅장하기까지 한 대작으로 남게 될 수 있었다.
어둡고 음산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슬슬 잡으며 시작하는 첫 번째 곡 Dark 3.11은 곧이어 보컬의 절규와 함께 터져 나오는 특유의 폭발적인 전개로 청자를 휘어잡는다.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전개를 통해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우주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Darkspace만의 기막힌 분위기 메이킹 능력이 역시나 돋보이며,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꽤 다채로운 구성과 완급조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10분이 넘어가는 곡임에도 루즈해질 틈이 없다. 참고로 중간에 잠깐 나오는 대사는 영화 Event Horizon에서 샘플링한 것이다.
도입부터 무겁게 찍어 누르는 Dark 3.12에선 차디찬 앰비언트 사운드가 돋보이며 마치 절대 영도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 내던져진 느낌을 주고, Darkspace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강렬한 저음의 기타 리프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곡의 무게감을 한층 더해준다. 또한 곡의 종결부에서는 서서히 내려앉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준다.
역시나 지글지글한 톤의 기타와 함께 시작하는 Dark 3.13 또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거칠게 휘몰아치는 전개를 펼쳐나간다. 하지만 곡 중반부에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육중한 기타 리프가 전면에 나서며 가공할 수준의 헤비함을 선보이는데, 이는 마치 Opeth가 6현 스탠다드 튜닝만으로도 무척 헤비한 리프들을 선보였던 것에 비견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를 짓는 구성 역시 아주 인상적이었다.
한편 더욱 비장하고 장중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Dark 3.14는 우주에 대한 단순한 공포를 넘어 경외심마저 느끼게 만드는 위력을 보여준다. 곡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다가 다시 한번 헤비한 리프가 등장하여 분위기를 잠깐 고조시킨 뒤 다시 정제된 스타일로 전환된다. 이 곡의 경우 지난 1, 2집을 포함한 Darkspace의 이전 곡들과 달리 거칠게 휘몰아치는 전개와 절규하는 보컬 없이도 무시무시한 우주의 분위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이들 디스코그래피에서 유일하게 대곡이 아닌 Dark 3.15는 잠깐 쉬어가는 앰비언트 트랙으로, 80분 가까이 꽉꽉 눌러 담은 이 앨범의 정주행을 돕는 인터미션 역할을 해 준다. 물론 이 곡은 이들의 성취가 단지 메탈적인 측면에서만의 역량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짧게나마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여섯 번째 곡 Dark 3.16은 개인적으로 지금껏 들어본 모든 부류의 음악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장엄한 도입부 중 하나를 들려주며 시작한다. 특유의 헤비한 기타 리프와 다크 앰비언트가 기막힌 조화를 이루어내며 그야말로 좌중을 압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을 정도이다. 고작 기타 두 대와 베이스, 드럼머신과 다크 앰비언트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사운드가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사운드 못지않은 웅장함을 줄 수 있다고 느낄 만큼 이 곡의 도입부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도입부 이후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John Carpenter의 영화 Prince of Darkness에서 샘플링한 것이다. 충격의 도입부로 시동을 건 뒤 다시금 로켓처럼 터져 나가는 이후 전개는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기존의 스타일로 청자를 무아지경에 빠트린다.
대망의 마지막 곡 Dark 3.17에선 좀 더 신비한 느낌으로 곡을 시작하다가 곧이어 Dark 3.16의 도입부에 버금가는 수준의 헤비한 리프와 웅장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후로는 Dark 3.14처럼 비교적 정제된 스타일을 보여주다가 곧이어 앨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돌입하듯 분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17분이나 되는 대곡 내내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며, 곡 중반부 이후로는 서서히 가라앉는 스타일로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유종의 미를 거둔다.
종합적으로 이 작품은 소위 코스믹 블랙 메탈이라고 불리는 스타일의 극한을 보여주는 앨범이자, 말 그대로 ‘분위기’를 중시하는 앳모스퍼릭 블랙 메탈계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대작이다. 80분 가까이 꽉꽉 채워 담은 장대한 구성으로 러닝 타임 내내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우주 한복판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분위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낸다. 평균 10분이 넘어가는 곡 구성과 앨범 전반적으로 일관된 편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면서도 쉽게 지루해지지 않는 세심한 짜임새와 완급조절을 느낄 수 있다.
쉴 틈 없이 거세게 몰아치면서도 때때로 헤비한 리프가 전면에 나서며 장중한 비장미를 더하고 더욱 알찬 곡 구성 또한 가능하게 해준다. 리프 구성은 대체로 단순한 편이고 톤 역시 거칠지만 특유의 분위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때때로 에픽한 느낌마저 들게 할 정도로 잘 짜여 있다. 인간으로서는 흉내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드럼 프로그래밍 역시 의도적으로 비인간적인 티를 냄으로써 인간성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우주의 무자비함을 표현해낸다. 멤버 세 명 모두의 절규로 이루어진 보컬은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담아내며, 마치 영화 Event Horizon의 지옥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수준의 아비규환을 연출해낸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느낌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앰비언트 사운드는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 신비롭고 웅장한 분위기, 그리고 공포와 경외심마저 느끼게 하는 분위기를 모두 만들어 준다.
이 앨범을 지하 벙커에서 녹음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레코딩 상태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지만, 사실 1, 2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끄럽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 때문에 공포적인 요소에 집중했던 1, 2집에 비해 이번 앨범은 조금 더 신비하거나 웅장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비인간적인 드럼 프로그래밍과 보컬들의 절규가 더해진 폭발적인 전개가 청자를 우주 미아로 만들어 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장미 넘치는 리프들과 신비한 스페이스 앰비언트로 우주의 장엄한 신비를 담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우주에 홀로 고립된 것 같은 공포와 그 거대한 장엄함에서 오는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Darkspace의 음악적 스타일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Tangerine Dream 같은 밴드나 아티스트에 의해 이미 50여 년 전부터 존재해온 스페이스 앰비언트 스타일을 블랙 메탈에 완벽히 접목시킴으로써 무음의 우주 공간에 대한 감상을 형상화하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창조해냈기 때문이다. 주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그 자체에 집중하는 스페이스 앰비언트와 달리 Darkspace는 블랙 메탈의 파괴적인 측면을 가장 적극적으로 조화시킴으로써 전대미문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침묵의 우주 공간을 역설적이게도 가장 시끄럽고 파괴적인 소리들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공포, 신비함, 경외 등과 같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감상을 실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Darkspace의 존재로 인해 우주를 테마로 한 일명 코스믹 블랙 메탈 밴드들이 다수 탄생하게 되었으나, Darkspace의 존재감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Midnight Odyssey, Alrakis, Mare Cognitum, Mesarthim, Battle Dagorath 등 많은 코스믹 블랙 메탈 밴드들이 저마다의 우주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Darkspace의 아성을 넘어설 만한 밴드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단, Mare Cognitum과 Spectral Lore같은 경우 나름 독자적인 색을 보여주면서도 Darkspace에 버금갈 만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본다.) 실제로 Darkspace는 2019년 스위스 베른 주에서 주최한 ‘Musikpreise 2019 des Kantons Bern’에서 수상하기도 했을 만큼 최근까지도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Darkspace가 독보적인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Paysage d'Hiver로도 알려진 핵심 멤버 Wroth의 역량이 그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물론 원맨 밴드인 Paysage d'Hiver와 달리 3인조 밴드였던 Darkspace의 경우 다른 두 멤버인 Zhaaral과 Zorgh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Zhaaral은 2009년 Sun of the Blind라는 원맨 밴드의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 2019년 Darkspace에서 탈퇴한 Zorgh는 Apokryphon라는 밴드를 결성하여 작년 앨범을 발매한 만큼 나머지 두 멤버도 작곡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베이시스트 Zorgh가 작년 진행한 인터뷰에서 타인과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포기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밴드를 만들었다는 식의 답변을 한 만큼 Darkspace의 주축은 역시 Wroth(Paysage d'Hiver)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추측에 의해 글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Darkspace가 줄곧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느라 그들에 대한 정보가 워낙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Zhaaral와 Zorgh같은 경우는 본명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이다.
아무튼 Darkspace의 주축으로 추정되는 Wroth의 역량은 이미 90년대부터 Paysage d'Hiver를 통해 증명된 만큼 Darkspace의 성공 또한 필연적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레코딩과 앰비언트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매우 파괴적인 스타일이 공존한다는 점이 Darkspace와 일맥상통하고, Darkspace가 우주의 분위기를 완벽히 그려낸다면 Paysage d'Hiver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의 풍경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만큼 Darkspace가 Paysage d'Hiver의 연장선에 있는 밴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Wroth가 인터뷰에서 Paysage d'Hiver가 ‘소우주’라면 Darkspace는 ‘대우주’라고 답한 것처럼 Paysage d'Hiver와 Darkspace는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실제로 2014년 발매된 Darkspace의 4집 Dark space III I 에서는 더욱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레코딩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러한 면모는 작년 발매된 Paysage d'Hiver의 첫 ‘정규’ 앨범 Im Wald에서 보여준 비교적 말끔해진 스타일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현재 Darkspace의 신작 발매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Paysage d'Hiver의 금년 신작 Geister가 작년 2월 이전에 이미 녹음을 마쳤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Darkspace의 귀환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한다. 비록 베이시스트 Zorgh가 탈퇴하기는 했지만, Darkspace는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 소리없는 우주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100/100 ... See More 3 likes 3 likes |
 Jambinai – Jambinai –
 은서 (隱棲) (2016) 은서 (隱棲) (2016) |
95/100 Aug 31, 2021 |

지난 6월 말 운 좋게도 잠비나이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라이브 공연을 보고 난 뒤에 잠비나이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매력을 더욱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한’의 정서나 아니면 최근에 주목받은 이날치 같은 경우의 ‘흥’과 같은 요소들을 차용한 퓨전 국악 아티스트와 달리 잠비나이의 경우 음악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뿌리부터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잠비나이의 2집 ‘은서’에서 이러한 잠비나이의 특색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함이나 분노 등 록/메탈 장르에서 추구되는 특유의 정서적인 요소이다.
포스트 록에서 느껴지는 우울한 분위 기나 하드코어/메탈 계열에서 날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모습 등을 계승한 잠비나이의 음악은 기존의 퓨전 국악으로 분류되던 음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잠비나이의 음악이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먼저, 그리고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잠비나이의 음악적 뿌리는 국악이 아닌 서양음악에서 찾을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잠비나이가 단지 기존의 록/메탈 스타일에 전통 악기를 살짝 얹은 수준에 그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전통 악기가 주는 울림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라이브에서도 차분히 앉아서 공연을 진행하고, 곡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악기들 역시 해금, 거문고, 생황 등의 전통 악기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잠비나이의 스타일이 국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 국악과도, 기존의 록/메탈 사운드와도 모두 다른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잠비나이는 이러한 자기만의 특색을 바탕으로 장르적 한계에서 벗어나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위대한 아티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발매된 잠비나이의 세 앨범들 중 가장 거칠고 어두우며 메탈 음악의 느낌이 강한 2집 ‘은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잠비나이의 작품이며, 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1집 ‘차연’과 마찬가지로 거친 앨범의 도입부를 장식하는 1, 2번 트랙 ‘벽장’과 Echo of Creation은 짧고 강렬한 곡 구성으로 잊을 수 없는 첫인상을 남겨 준다. 특히 1번 곡 ‘벽장’은 박진감 넘치는 곡 전개와 보컬 이일우의 절규가 더해지며 처음 들었을 당시에 제법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곡이다.
반면 비교적 밝고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곡을 진행시켜 나가는 ‘그대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는 곡의 제목처럼 어두운 앨범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이 빛나는 트랙이다. 실제로 프론트맨 이일우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곡은 국악계 음악 컨테스트의 서류 및 음원 심사에서 탈락했던 곡이지만, 앨범 발매 이후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곡이라고 한다.
네 번째 곡 무저갱은 잠비나이의 디스코그래피에서도 가장 독특한 곡일 것이다. 래퍼 이그니토의 특색 있는 목소리가 염세적인 가사와 곡 분위기와 어울리며 실로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마치 대취타의 도입부를 연상시키는 다섯 번째 곡 ‘부디 평안한 여행이 되시길’은 이내 무겁게 짓누르는 전개로 이어지며 웬만한 슬럿지 메탈 못지않은 출력과 무게감을 선사해 준다.
6번째 곡 억겁의 인내에서는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포스트 록적인 스타일이 느껴지면서도, 다음 곡 Naburak에선 잠비나이만의 박진감 넘치는 스타일과 연주 기법이 돋보인다.
마지막 곡 ‘그들은 말이 없다’는 마지막 곡답게 가장 고조된 분위기로 치닫는 곡이다.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한 이 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들’에 대한 분노를 한껏 표출해내는 곡이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메시지를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 곡의 진가는 지난 6월에 본 라이브에서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는데, 접신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퍼포먼스와 고막을 자극하는 고출력의 사운드 덕분에 앨범 버전을 상회하는 수준의 강렬한 임팩트를 남겨 주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잠비나이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며 거친 앨범이다. 물론 ‘그대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처럼 희망적인 느낌의 곡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프론트맨 이일우의 과거 경력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드코어/메탈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 리스너라면 이 앨범으로 잠비나이에 입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잠비나이가 꾸준히 활동해 오며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정도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 잠비나이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대중적인 관심을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물론 더 큰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잠비나이는 조용하지만 착실하게 앞으로도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잠비나이는 어느덧 10년 이상 활동해 오며 이제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관계없이 무시할 수 없는 아티스트로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잠비나이의 성공은 독자적인 오리지널리티에서 비롯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독창성이 앞으로도 잠비나이를 더욱 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96/100 ... See More 6 likes 6 likes |
 MMSA's profile
MMSA's profile









































 W.A.S.P. –
W.A.S.P. –
 The Crimson Idol (1992)
The Crimson Idol (1992)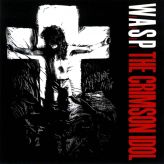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4 likes
4 likes Ethereal Shroud –
Ethereal Shroud –
 Trisagion (2021)
Trisagion (2021)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4 likes
4 likes Teitanblood –
Teitanblood –
 Death (2014)
Death (2014) “대체 이런 걸 왜 들어요?”
“대체 이런 걸 왜 들어요?” 8 likes
8 likes Darkspace –
Darkspace –
 Dark Space III (2008)
Dark Space III (2008)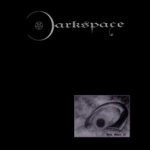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3 likes
3 likes Jambinai –
Jambinai –
 은서 (隱棲) (2016)
은서 (隱棲) (2016) 지난 6월 말 운 좋게도 잠비나이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라이브 공연을 보고 난 뒤에 잠비나이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매력을 더욱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한’의 정서나 아니면 최근에 주목받은 이날치 같은 경우의 ‘흥’과 같은 요소들을 차용한 퓨전 국악 아티스트와 달리 잠비나이의 경우 음악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뿌리부터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잠비나이의 2집 ‘은서’에서 이러한 잠비나이의 특색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함이나 분노 등 록/메탈 장르에서 추구되는 특유의 정서적인 요소이다.
지난 6월 말 운 좋게도 잠비나이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라이브 공연을 보고 난 뒤에 잠비나이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매력을 더욱 절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소위 말하는 ‘한’의 정서나 아니면 최근에 주목받은 이날치 같은 경우의 ‘흥’과 같은 요소들을 차용한 퓨전 국악 아티스트와 달리 잠비나이의 경우 음악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뿌리부터 다른 곳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잠비나이의 2집 ‘은서’에서 이러한 잠비나이의 특색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함이나 분노 등 록/메탈 장르에서 추구되는 특유의 정서적인 요소이다. 6 likes
6 likes
 Imperial Triumphant –
Imperial Triumphant –
 Alphaville (2020)
Alphaville (2020) 1 like
1 lik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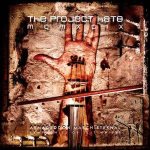
 The Project Hate –
The Project Hate –
 Armageddon March Eternal (Symphonies of Slit Wrists) (2005)
Armageddon March Eternal (Symphonies of Slit Wrists) (2005) 3 likes
3 likes
 Chapel of Disease –
Chapel of Disease –
 ...And as We Have Seen the Storm, We Have Embraced the Eye (2018)
...And as We Have Seen the Storm, We Have Embraced the Eye (2018) 11 likes
11 likes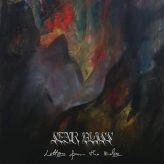
 Sear Bliss –
Sear Bliss –
 Letters from the Edge (2018)
Letters from the Edge (2018) 1 like
1 lik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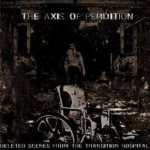
 The Axis of Perdition –
The Axis of Perdition –
 Deleted Scenes from the Transition Hospital (2005)
Deleted Scenes from the Transition Hospital (2005) 1 like
1 like
 Ghost –
Ghost –
 Prequelle (2018)
Prequelle (2018) 2 likes
2 likes
 Weapon –
Weapon –
 From the Devil's Tomb (2010)
From the Devil's Tomb (2010) 1 like
1 like
 Rapture –
Rapture –
 Paroxysm of Hatred (2018)
Paroxysm of Hatred (2018) 1 like
1 like
 Necrophobic –
Necrophobic –
 Mark of the Necrogram (2018)
Mark of the Necrogram (2018) 2 likes
2 likes
 Basalte –
Basalte –
 Vertige (2018)
Vertige (2018) 1 like
1 like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ital Remains –
Vital Remains –  Dechristianize (2003)
Dechristianize (2003)
 Vulture Industries –
Vulture Industries –  The Tower (2013)
The Tower (2013)
 Vulture Industries –
Vulture Industries –  The Tower (2013)
The Tower (2013)